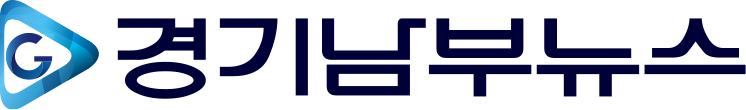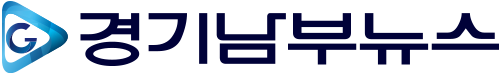사전적 의미의 항복은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리어 굴복함이다.
전쟁에서의 항복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패배감과 죄책감,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을 감당하는 일이다. 한 나라의 깊은 자기 붕괴의 순간이다. 전쟁을 지속할 힘도 명분도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잔혹했던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항복이 있다.
탕자의 이야기이다.
오만으로 똘똘 뭉친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기생과 함께 지내면서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걸 깨닫는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돌아갈 수 있을까?’
옳다고 믿었던 자신을 내려 놓는 순간,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그의 ‘무조건 항복’이다.
탕자의 비유가 끝을 맞이하는 방식은 달랐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껴안고 잔치를 벌인다. 그에게 ‘과거의 죄’보다 ‘돌아온 선택’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다.
참되고 아름다운 항복이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항복의 의미이다.
전쟁의 상처와 탕자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맥락에 존재하지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죄와 실수의 그림자를 지나 새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전쟁은 인류에게 파괴의 끝을 보여주고, 탕자의 비유는 인간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크고 작은 항복을 해야 하는 순간이 나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
고집부리며 버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다는 걸 배웠다. 이제는 두 손을 들며 ‘무조건 항복’이라 외친다.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항복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