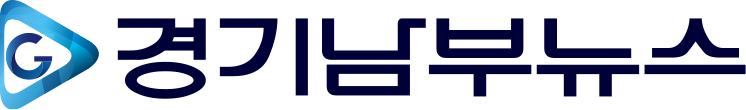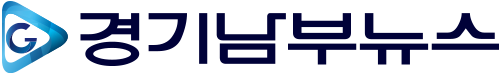[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거리 곳곳에 서 있던 주황색 공중전화기를 기억하는가. 그 작은 부스 안에서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던 그 순간의 설렘을. 때론 앞사람의 통화가 끝나길 길게 기다리며, 손에 쥔 동전을 굴려가며 초조하게 서 있던 그 시절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집에 연락할 일이 생기면 주머니 속 10원짜리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를 찾아 헤맸다. 수화기에서 들리는 "삐삐삐" 소리와 함께 동전이 떨어지는 청량한 소리는 소통이 시작되는 신호였다.
공중전화 부스는 작은 비밀 공간이기도 했다. 투명한 벽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그 안에서는 오롯이 나와 상대방만 존재했다. 첫사랑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던 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고 기다리던 그 순간들.
급한 ‘삐삐’ 호출을 받고 전화기를 찾아 헤메던 기억들. 지금은 오롯이 기억 한구퉁이에 작은 방 하나를 간직하고 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와든 연결될 수 있지만, 그때는 달랐다.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고, 동전이 있어야 했고, 상대방이 집에 있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 불편함 속에 오히려 진정한 소통의 가치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거리에서 공중전화를 찾기란 쉽지 않다. 가끔 발견하면 낡고 고장 난 채로 서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공중전화기는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소중히 여기던 시절의 추억 속으로 사라진 풍경이다. 이제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모든 걸 대신하지만, 가끔은 그 초록색 부스가 아무 데서나 툭 튀어나와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장난스럽게 말을 걸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