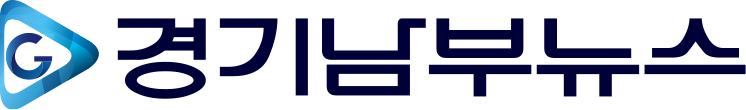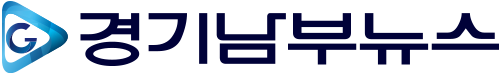[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2026년의 문은 산에서 열렸다. 새해 첫 일출을 맞기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수원과 화성의 경계를 잇는 칠보산으로 향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로 산은 이미 깨어 있었고, 인근 도로는 차량들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새해를 향한 간절함이 차 있었을 것이다.
아침 7시, 출발. 돌계단을 밟으며 군중 속에 섞여 제3전망대로 오른다. 숨은 차오르지만,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다. 7시 30분, 탁 트인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동이 트기를 기다린다. 찬 공기 속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7시 45분, 마침내 해가 모습을 드러낸다. 붉은 빛이 하늘을 밀어 올리고, 사람들은 한해의 소망을 바라며 해를 바라본다.
그 순간, 한 젊은 아가씨가 동영상을 찍으며 큰 목소리로 외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서로 화답을 한다. 낯선 이들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같은 해를 바라보는 마음은 똑같았다.
해를 뒤로 한 채 하산해 떡국으로 새해 첫 끼를 나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1월 3일 토요일 새벽,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산과 더 가까워지는 여정이었다. 성대역에서 명학역까지 전철로 이동해 6시 50분 출발. 성결대학교 옆 등산로로 접어들자 곧 경사는 가팔라지고, 땀은 비 오듯 흐른다.
7시 35분, 관모봉정상.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인천 방향 하늘엔 아직 달이 남아 있다. 숨을 고르며 바라본 청계산, 백운산, 광교산 능선 위에 붉은 여명이 드리운다.
잠시 후, 해가 광교산 형제봉 위로 천천히 떠오른다. “와—” 말보다 먼저 탄성이 터져 나온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반응이다.
이후 태을봉을 거쳐 슬기봉, 꼬깔봉, 부대옆봉, 수암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걷는다. 병목안시민공원으로 하산했지만, 안양역으로 가는 52번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결국 걸어서 역까지—이날의 기록은 16.5km였다.

새해 첫날과 오늘, 두 번의 일출산행은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속에 나를 깊이 담그는 시간이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월 4일 주일 오후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출발해 광교헬기장, 통신대헬기장, 백운산과 광교산, 형제봉을 지나 광교저수지로 이어지는 21.5km 환종주를 마쳤다.

산은 길고, 하루는 짧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걷기는 계속되었다. 금곡동공원 트레킹, 칠보산 야간산행, 그리고 1월 11일의 광교산 19.7km 종주. 하광교소류지에서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험난했고, 마치 강원도 치악산을 오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강풍 속에서 스마트폰 전원이 두 번이나 급방전될 만큼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1월 12일, 다시 칠보산 야간산행(7.7km).
2026년의 시작은 이렇게 산과 함께였다. 해는 매일 뜨고 지지만, 그 해를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했는지는 오래 남는다. 능선을 걸으며 흘린 땀, 바람에 흔들린 태극기, 낯선 이들과 나눈 새해 인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길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걷는 이에게는 분명한 답을 준다. 올해도 이렇게, 한 걸음씩.